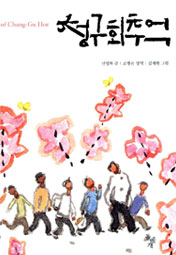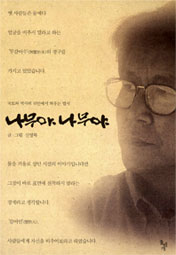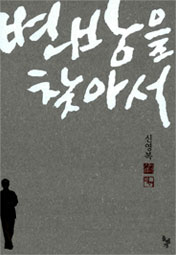글모음
| 게재일 | 2005-10-18 |
|---|---|
| 미디어 |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
노래가 없는 세월의 노래들
나의 경우 노래는 학교에 있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우리 집 분위기가 상당히 완고하였기 때문이었다. 노래는 학교에서나 부르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마저도 해방직후에 입학한 우리세대에게는 동요가 없었고 기억되는 노래는 중고등학교 때의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였는데 그것 역시 별로 감동적인 것이 못되었다.
예를 들자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 . . . ” <사월의 노래>가 그것이다. 목련꽃 그늘이라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들에게는 감동이 있을 리 없었다. <사월의 노래>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류의 노래가 학교음악의 주류였다.
4.19와 5.16을 대학시절에 겪은 우리들의 세대는 대단히 불행한 세대였다고 자부한다. 우리의 대학시절은 우리 것에 대한 단 한 줌의 자부심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시절이었다. 오랜 식민지 시절이 끝나기는 하였지만 해방정국의 혼란과 분단, 부패, 전쟁 등 일련의 비극적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 지배하의 분단국가답게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을 지향하는 소위 근대기획이 사회의 기본적 건축의지로 굳어진다.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는 대학사회가 아마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하게 된다. 우리의 대학시절에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팝송들이 불려졌다. 팝송과 함께 정확한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또 상당히 많은 샹송도 불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 아리아도 뒤지지 않았다.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 사랑의 묘약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은 기본이었다. 노랫말도 잘 알지 못하는 오페라 아리아들과 클래식 음악이 대학 캠퍼스와 시내의 음악 감상실을 석권하게 된다.
아마 4.19와 5.16을 겪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고 기억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찾아낸 노래들이 있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되는 <희망가>도 그 중의 하나였는데 일제시대의 노래를 다시 찾아 부르면서 일제식민지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정서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낯 설은 남자 품에 얼싸 안겨.....”라는 <댄서의 순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곡명으로 불렸는가 하면, <에레나가 된 순희>는 <한국농촌사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석유 불 등잔 밑에 밤을 지새며 실패 감던 순희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이야기이다. 불행한 시절의 불행한 노래였다. 그런 점에서 노래가 없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받은 정서마저 담을 그릇이 없었다. 오죽하면 4.19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부른 노래가 <전우야 잘 자라>라는 군가였을까.
나는 이처럼 삭막한 세월의 연장선상에서 20년의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감옥에 노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다. <부베의 연인>이란 영화의 주제음악이 그것이다. <부베의 연인>은 아마 내가 구속되기 얼마 전에 본 몇 편 안 되는 영화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영화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소개할 필요도 없지만 징역 초년 나는 <부베의 연인>의 주제가를 자주 읊조리고 있었다. 감옥에는 노래를 부를 공간이 없다. 주로 독방에 수용되어 있을 때 나직이 읊조렸다. <부베의 연인>을 기억하는 것은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주는 애절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4년 형을 복역하고 있는 부베(조지 차키리스)를 접견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가는 마라(클라우디아 카르디나레)의 모습이다. 차창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주제곡이 배경음악으로 깔린다. 역시 감옥 초년이던 내게 그 장면이 인상 깊게 회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빨치산으로 투신하여 파시스트 경찰을 살해하여 계속 쫓기고 있는 부베와 그의 가난한 연인 마라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의 역정은 당시의 불행한 시대와 부딪혀 가면서 엄혹한 우여곡절을 펼쳐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회상이 끝나면서 다시 처음의 차창으로 돌아온다. 마라는 14년의 형기가 끝날 때의 나이를 꼽아보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임을 위안으로 삼는 독백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내게는 그런 연인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베의 연인>주제곡이 징역 초년의 나의 주제음악이 된다. 아마 당시의 나의 심정을 그런대로 담을 수 있었던 회한(悔恨)이 그 노래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징역 산 햇수가 10여년이 지나면서 나는 다른 노래를 갖게 된다. 그것이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였다. 아마 내가 어렵게 입수한 ‘가요집’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는 것이었다.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고, 못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그 시절의 내게 매우 절실한 정서였다. 이 노래는 페루의 전통 민요곡을 기타리스트인 로블리스(Daniel Alomias Robles)가 편곡한 멜로디에 사이먼과 가펑클이 나중에 노랫말을 붙인 것이다. 10여년 이상 갇혀 있던 내게는 매우 절실한 의미로 다가오는 노래였다.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소망도 물론 간절하지만 내게는 차라리 제일 마지막 구절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다. 길보다는 차라리 숲이 되고 싶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I'd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 징역 현실을 떠날 수 없었던 내게 숲은 더 큰 의미로 읽혀졌다. "I will rather feel the earth beneath my feet." 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숲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떠날 수 없는 곳이지만 그 곳을 숲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훗날 내가 비극의 도시 마추픽추의 산상에서 잉카의 악기로 듣는 <엘 콘도르 파사>가 바로 숲의 이야기임을 확인하게 된다. 숲을 이루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 있는 이 산상의 도시는 비극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피사로가 이끄는 침략자들에게 쫓기고 쫓기던 잉카인들에게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이 폐허는 이야기 하고 있었다. 내가 이 <엘 콘도르 파사>는 내가 그러한 고민을 가졌던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삭막한 폐허인 감옥을 숲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러한 잠재적인 의식이 나로 하여금 이 노래와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감옥은 노래가 없는 곳이고 노래가 없는 세월이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부베의 연인>이든 <엘 콘도르 파사>든 감옥에서의 노래란 독방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환상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쁜 노래는 물론이고 슬픈 노래라 하더라도 노래는 감옥과 어울리는 것일 수가 없다. 진정한 노래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논의를 일단 접어두고 노래라는 형식의 모든 노래를 노래라고 한다면 감옥이라 하여 노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소자를 떠나보내는 가난한 송별파티에서 돌아가며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추렴으로 오복 건빵과 마가린을 구입하여 마가린에 건빵 찍어 먹으면서 벌이는 가난한 송별파티에 노래가 있다. 건빵 1봉지씩 나누어 받은 행복함이 노래를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인 셈이다. 벽기대고 빙 둘러 앉아서 돌아가며 노래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나는 20년 동안 내 차례가 되어 피치 못하는 경우에는 1가지 노래만 불렀다. 그것이 유명한(?) <시냇물>이란 동요이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시냇물>은 동요에다 짧기도 하여 노래로 쳐주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년간 출소자 송별파티에서 부른 노래는 언제나 <시냇물>이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시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다시 바다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차츰 숙연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억된다.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는 대목에 이르면 다 같이 바깥세상을 생각하는 눈빛이 되었다.
출소한 이후에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노래를 불렀다. 물론 남 앞에서 부를 만큼 자신 있는 노래가 없었기도 하였지만 20년 동안 노래가 없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에게 그래도 어울리는 노래가 <시냇물>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의 표정이 감옥에서 보았던 표정과 다르지 않았다. “넒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는 대목에 이르면 감옥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과 같은 눈빛이 되었다. 먼 곳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다. 바깥사람들도 갇혀 있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감옥 20년의 마지막 즈음에 나는 또 하나의 노래를 만나게 된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이다. <떠나가는 배>를 읊조리는 젊은 친구가 있었다. 새로 들어 온 젊은 사람이었는데 가사도 전부 알고 있지는 못하였고 곡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가사나 곡이 참 좋게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와 곡을 수소문하였다. 그래서 아마 악대부원한테서 악보와 가사를 적은 종이쪽지를 받게 된다. 그 쪽지를 들고 그 젊은 친구와 함께 노래를 익혔다. 이 노래를 거의 익힐 무렵에 내가 출소하게 된다. 나는 출소하기 이틀 전에 내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가족 접견 때 듣게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차마 출소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내일 모래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떠나가는 배>를 함께 부를 때의 심정이 매우 착잡하였다. “겨울비에 젖은 돛에 가득 찬바람을 안고”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떠나간다.”는 가사가 마치 내 이야기 같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때의 정경이 떠오른다.
20년 동안 노래가 없는 세월을 살고 난 다음 세상에 나왔을 때 노래는 충격이었다.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역을 맡은 팀 로빈스가 교도소 내의 유선 방송실에서 음악을 내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장면은 교도소 운동장을 가득히 채운 재소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어 노래를 듣는 광경이다.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최대의 볼륨으로 희색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모차르트의 아리아는 재소자들의 심금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모차르트의 ‘휘가로 결혼’ 중에서 맑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편지의 이중창>이었다. 더구나 매혹적인 여성 이중창이라는 점에서도 가히 환상적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출소 후에 노래를 들을 때의 감회가 바로 쇼생크감옥의 재소자들이 받았던 감동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것은 그 동안의 노래운동의 성과였다. 다른 운동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 노래운동이 도달한 성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뛰어난 것이었다. 출소 당시에 접한 노래들이 그랬었다. <그날이 오면>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처럼 결코 거칠지 않은 전투성이 그랬었고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상록수>처럼 결코 감상적이지 않은 서정성이 그랬었다. 감동적인 노래들이 참 많았다. 나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노래모음 테이프를 받아서 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노래들로 어느 한적한 오후의 빈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기도 한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신 영 복
노래를 찾는 사람들 - 지금 여기에서 2005.10.
| 분류 | 제목 | 게재일 | 미디어 |
|---|---|---|---|
| 기고 | "자본주의 극복 대안,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다" - 프레시안 2004.12.16 | 2004-12-16 | 프레시안 |
| 기고 | "하나되라" 저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 한겨레신문 창간네돌 특집 1992.5.15 | 1992-05-15 | 한겨레신문 |
| 기고 | 2015 만해문예대상 수상 소감 | 2015-07-26 | 더불어숲 |
| 기고 | [느티아래 강의실] 나의 대학시절,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 2009-06-22 | 한울 |
| 기고 | ‘석과불식’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할 희망의 언어 - 한겨레 2013.5.13. | 2013-05-13 | 한겨레신문 |
| 기고 | 강물과 시간 - 진보평론 제3호(2000년 봄호) | 2000-03-01 | 진보평론 |
| 기고 | 개인의 팔자 민족의 팔자 - 한겨레신문 1990.2.22. | 1990-02-22 | 한겨레신문 |
| 기고 | 나눔, 그 아름다운 삶 - 동아일보 2000.5.4. | 2000-05-04 | 동아일보 |
| 기고 | 내 기억 속의 기차이야기 - 레일로드 2000년 9월 | 2000-09-01 | 레일로드 |
| 기고 | 노래가 없는 세월의 노래들 -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2005.10. | 2005-10-18 |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