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육상 기자]"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 ▲ <더불어숲>표지 | |
| ⓒ2004 중앙M&B |
'새로운 세기의 길목에서 띄우는 신영복의 해외엽서'라는 부제를 단 <더불어숲> 표지에 있는 글귀다. 작가는 이 책을 1998년 출판했다. 필자가 오래 전 책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비록 세기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더불어 숲'의 의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은 시인은 '이 책을 읽는 이에게'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어떤 진실은 그것이 고백을 닮을 때 더욱 절실하게 됩니다. 신영복 교수의 지적 염원이 유감없이 반영된 이 책의 산문은 그런 고백과 동행하는 신비를 슬쩍슬쩍 내보이기도 합니다ㆍ과연 그가 찾아간 새로운 세기에의 예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시대와 지역에서의 성장소설적 문화를 지향할 때 만날 수 있는 인간 자신의 새 각성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고백, 염원, 각성…더불어 숲이 주는 커다란 선물
진실에 대한 고백과 지적 염원 그리고 새로운 각성은 <더불어 숲>이 독자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다. 세계 각국의 역사현장에서 띄운 엽서에는 20년이 넘게 무기수로 옥살이를 했던 작가의 역사 인식과 삶의 통찰, 고뇌가 잔뜩 묻어난다.
<말콤 X>를 읽고 아마 생전 처음으로 화이트(White)와 블랙(Black)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 두 단어에 담긴 뜻의 엄청난 차이에 놀랐던 나의 감옥이 회상되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은 색(色)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선(善)과 악(惡), 희망과 절망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희망은 절망의 땅에 피는 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망이 다른 누군가의 절망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희망봉과 로벤섬' 중에서-
| ▲ '콩코드광장의 프랑스 혁명' 삽화 | |
| ⓒ2004 신영복 |
작가는 선과 악에 놀라고 희망과 절망의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한다. 희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희망이 아니다. 작가는 선과 악, 희망과 절망을 함께 아우르는 동반의 개념으로 인식을 넓혀 간다.
반(半)은 절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반(伴)을 의미합니다. 동반(同伴)을 의미합니다…'절반의 환희'는 절반의 비탄과 같은 것이며, '절반의 희망'은 절반의 절망과 같은 것이며, '절반의 승리'는 절반의 패배와 다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희망과 절망, 승리와 패배라는 대적(對敵)의 언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반의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희망봉과 로벤섬' 중에서
반(半)은 절반과 동시에 동반(同伴)을 의미
절반의 경계를 잘 절제한다면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참으로 멋지다. 반은 '절반'이면서 동시에 '짝'이다. 반은 동반자다.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말만 많은 대한민국 국회가 떠오른다. 서로 절반의 승리만을 외치지 말고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작가는 프랑스 혁명의 콩코드 광장에 서서는 '자유ㆍ평등ㆍ박애'의 혁명 이념은 진정한 교훈이 된다고 말한다. 인식의 혁명이 요구된다. 위기에서 오는 교훈을 올곧게 받아들여야 함은 시간이 흘러도 유효하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혁명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인류사가 겪었던 모든 혁명의 국면과 명암이 망라되어 있습니다…혁명이란 당신의 말처럼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어내려는 미지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인식의 혁명입니다.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파의 구상은 당신의 말처럼 관념적으로 선취된 이상과 그 이상에 도취되고 있는 정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틀이 와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틀에 대한 분명한 구상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의 그 숱한 우여곡절과 좌절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콩코드 광장의 프랑스 혁명' 중에서-
| ▲ '베를린의 장벽에서' 삽화. '사상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비행처럼 자유로운 것이다' |
| ⓒ2004 신영복 |
낡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분명한 구상이 없음이 위기다. 위기는 프랑스 혁명만이 아니다. 교훈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하는 각종 개혁 법안들에도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낡은 틀로 와해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한 구상과 실천이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이 넘는 옥살이를 한 작가의 교훈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한국이 독일 통일을 모델로 삼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통일 의지를 듭니다. 독일에서는 통일을 독립의 의미로 읽고 있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 노력은 독일 민족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는 전통적 의지의 연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분단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비행처럼 자유로운 것이다.' 분단이란 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을 가르려고 하는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하는 글귀입니다. 누군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리라.'
독일의 통일 그것은 분명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먼저 민족적 신뢰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배울 수밖에 없는 모델임에 틀림없습니다. – '베를린 장벽' 중에서-
국회, 국가보안법, 신행정수도, 도룡뇽, 수능…더불어 숲이 필요하다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 통일에도 동반에도 필요하다. 사상은 자유로운 것이라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하늘을 가르는 헛수고는 대한민국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통제할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베를린 장벽에 한글로 써있는 '우리도 하나가 되리라'는 말이 가슴을 저미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38선을 거둬내고 싶기 때문이다.
더불어 숲이 되려면 나무와 나무가 서로 모여야 한다. 나무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깨동무를 하며 숲을 이룬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불어 숲'이 필요한 곳이 많다. 흩어져 싸우는 국회가 그렇다. 국가보안법 논의가 그렇다. 신행정수도로 홍역을 치르는 나라가 그렇다. 지율스님과 도룡뇽이 그렇다. 수능사고의 수험생과 교육부가 그렇다.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나무가 말하는 숲의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최육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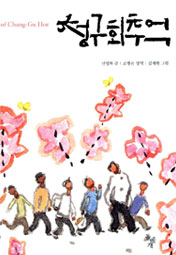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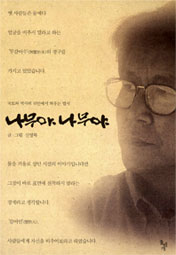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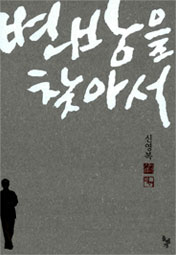

 [기사] 신영복·정호승·이지상이 한 무대에-나팔꽃 콘서틍
[기사] 신영복·정호승·이지상이 한 무대에-나팔꽃 콘서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