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여는새날(공지)
내가 춤출 수 없다면 나의 미래가 아니다 - 임민욱, 경향신문 2014.01.14
경향신문 2014.01.14
[문화와 삶]내가 춤출 수 없다면 나의 미래가 아니다
임민욱 | 설치미술가
12월31일 밤,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보려고 집을 나섰다. 제야의 종이 울리는 거리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딸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나 그것이 딸아이를 전장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줄은 몰랐다. 끝도 없이 진을 친 경찰 버스는 시민을 상대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포위당한 축제 인파는 무대를 향해 떠밀렸고 떠밀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야의 종 행사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옆으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정조준하듯 시민들을 감시하고, 연인들은 그 앞에서 수줍게 껴안은 채 2013년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0, 9, 8, 7,… 군중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시동을 건 채 대기하는 경찰 버스에서 있는 대로 매연을 뿜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매연에 잠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서로 쓰다듬고 축하하며 입맞춤이라도 해야 할 그 순간에 휴대폰만 어루만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허공에는 초라한 폭죽 몇 개가 피식거리며 솟아 올랐다. 그렇게 감시의 감시에 의한 감시를 위한 박근혜 정부와 어울리는 제야의 종이 새마을 새벽종처럼 땡땡땡 깨며 울렸다. 정말 썰렁하게 맞이한 새해였다.
흔히 새해를 ‘맞이한다’고 표현했을 때는 마치 시간의 객관적 실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부여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를 청산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의 편에 서있을 것이다. 그때 미래는 현재를 향해 다가오는 구도에서 수용시킬 뭔가를 쥐고 있다. 그런데 누가 선취해서 거머쥔 미래인가?
신영복 선생은 새천년을 바라보는 2000년 벽두에 그런 인식의 문제점을 진보평론에 이렇게 썼다. “새로운 미래라는 관념은 현재를 왜소하게 만들고 우회하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를 현재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사회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오류의 근거가 된다.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유보하거나 우회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선취된 미래담론은 현실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우민화하면서 가장 먼저 ‘통합’이라는 형식논리로 포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정치화라는 통제방식이 가장 성공적이 되고 현재의 모순을 직시할 수 없이 미래의 계기는 점령당한 채 하달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러한 전략기획의 영역으로 접수된 미래개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은폐와 우회를 위해 ‘국민 대통합’ 포장지로 감싼 후 ‘우리가 남이가’ 아버지 그림자들을 덕지덕지 달고 나타났다. 과거가 누적된 현재에 ‘환희와 비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승인하는 용기’ 없이 누가 그 미래에 춤을 추는가.
나처럼 현실정치에 무심했던 예술가들도 확연히 감지했던 2013년의 모순적 변화들이 있었으니, 으뜸이 국정원의 존재감이었고 둘째가 군인들의 타이밍이었다. 음지에서나 헌신하겠다던 맹세는 어디가고 대놓고 활보하는 폼이 인상적이었다. 매트릭스 영화 같은 까만 선글라스 끼고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도 재미있게 지켜봤다. 셋째는 뻔한 결론, ‘나머지는 알아서 긴다’는 명령 일반화가 자체 검열로 창조의 씨를 말리는 사회 분위기였다. 선거조작 선배들이 돌아와 병풍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뭘 더 기대하는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였구나, 곱씹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몰아넣고 뜯어고쳐 보겠다는 식의 위협적 선도에 올해의 키워드는 단연코 공포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누가 두려운가. 나를 미래로 이끄는 것은 자유다. 신영복 선생이 말했듯 “자기의 이유로 걸어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정권의 미래와 혁명에 누가 춤추는가. 20세기 초 혁명가 에마 골드먼은 말했다. “만약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혁명이 아니다.” 혁명 대신 점령당한 미래를 되찾아와야 한다. 내가 춤출 수 없는 미래는 나의 미래가 아니다.
-
Read More
[서현의 내 인생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경향신문 2014.07.09
Date2014.07.21 By뚝딱뚝딱 -
Read More
교화 의미 담은 교도소 역사의 아픈 기억 간직 - 새전북신문 2014년 07월 09일
Date2014.07.14 By뚝딱뚝딱 -
Read More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르칠 뿐 - 주간조선 [2311호] 2014.06.16
Date2014.06.18 By뚝딱뚝딱 -
Read More
동양고전에서 길을 찾다 - 디트news24 2014.06.17
Date2014.06.18 By뚝딱뚝딱 -
Read More
[우리를 깨우는 오픈강좌] 1강 - 신영복 교수의 사람과 사회 6월 11일 (수)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
Date2014.06.03 By뚝딱뚝딱 -
Read More
돌베개, 30년 넘게 사랑받는 비결 - yes24 채널예스 2014.02.07
Date2014.02.10 By뚝딱뚝딱 -
Read More
옷깃을 여미며 청명 임창순의 삶을 더듬어 보다 - 김성장, 프레시안 2014.01.22
Date2014.02.03 By뚝딱뚝딱 -
Read More
2014년 더불어숲 새해 모두모임
Date2014.01.21 By뚝딱뚝딱 -
Read More
위대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없다 - 이강백, 프레스바이플 2014.01.14
Date2014.01.16 By뚝딱뚝딱 -
Read More
내가 춤출 수 없다면 나의 미래가 아니다 - 임민욱, 경향신문 2014.01.14
Date2014.01.16 By뚝딱뚝딱 -
Read More
행복해지려면 혼자서 말고, 손잡고 올라라 - 한겨레신문 2014.01.08
Date2014.01.08 By뚝딱뚝딱 -
Read More
겨울 새벽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 동아일보 2014.01.07
Date2014.01.08 By뚝딱뚝딱 -
Read More
아듀 2013! 종강콘서트 열려 - 성공회대
Date2013.12.31 By뚝딱뚝딱 -
Read More
세상에 이런 엇박자가 또 있을까 - 매일노동뉴스 2013.12.23
Date2013.12.27 By뚝딱뚝딱 -
Read More
2014년 더불어숲 서여회(書如會) 신입회원 모집
Date2013.12.24 By뚝딱뚝딱 -
Read More
2013 성공회대학교 종강콘서트
Date2013.12.17 By뚝딱뚝딱 -
Read More
2013 송년특강 열정강좌 “신영복의 공부” - 2013년 12월 11일(수) 안산
Date2013.12.11 By뚝딱뚝딱 -
Read More
평생 공부 - 서울경제신문 2013.12.09
Date2013.12.10 By뚝딱뚝딱 -
Read More
더불어숲 서여회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Date2013.12.05 By뚝딱뚝딱 -
Read More
“수능 본 아이들아, 이 책 한 번 읽어보렴“ - ZDNet Korea
Date2013.11.25 By뚝딱뚝딱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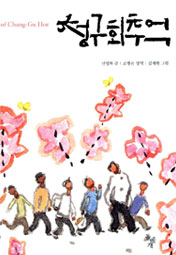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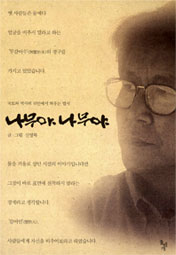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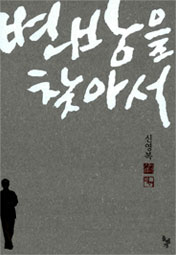

 행복해지려면 혼자서 말고, 손잡고 올라라 - 한겨레신문 2014.01.08
행복해지려면 혼자서 말고, 손잡고 올라라 - 한겨레신문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