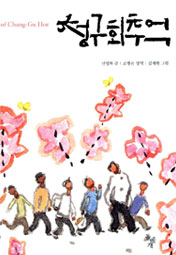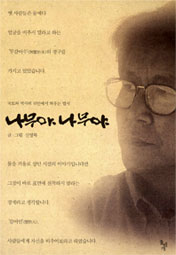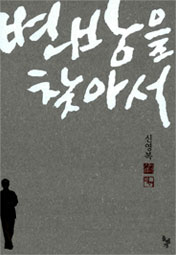이미지 클릭하면 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숲속의소리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밑을 지나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잡초가 우거진 검단 수로엔 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등 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그런 풍경이 익숙하다. 옆자리에 앉아 연신 담배를 태우는 현수형도 한때는 저 강태공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죽였다고 했던가.
수로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비포장도로 한 켠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얹은 개나리가 누렇게 피어있다. 개나리는 논길을 지나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 개나리 사이로 우중충한 천막이 보였다. 저 천막이 허연 눈을 뒤집어쓰고 있을 때, 우리들은 공장 문을 나섰었다.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가. 하얗던 눈길은 이미 노란 개나리 길로 바뀌어 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작년의 월급을 찾아 이렇게 조퇴를 하고 달려오는 것이다.
공장은 조용했다. 색이 바랜 컨테이너 사무실을 들어서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날 부른다.
“정원 형, 쯔드라스트 브이찌(안녕하세요)”
청색 털모자를 눌러쓴 푸른 눈의 사내가 털이 송송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코빌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육 개월 전에 코리아로 날아 온 친구, 코리아에 오자마자 처음 들어온 공장이 이곳이었다. 그리곤 내 조수가 되어 날마다 콧등이 뿌옇게 나무먼지를 뒤집어쓰던 친구. 쉬는 시간이면 내 손에 이끌려 동네 가게에서 종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허옇게 웃던 친구. 그 웃음 뒤엔 항상 내 얼굴에 엄지손가락을 세워 내밀곤 했다. 스물아홉에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코빌은 칠십만 원의 월급을 타서 육십만 원을 가족에게 보냈다. 나머지 돈으로 공장 뒤편에 허름한 농가에서 친구들과 공장 화목을 주워다 아궁이에 불을 때며 겨울을 살았다.
난 코빌의 손을 맞잡고 그의 어깨를 쳤다. 코빌도 두툼한 손으로 내 어깨를 두드린다. 아직 한국말이 서투른 코빌은 연신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갑에서 쪽지를 꺼낸다. 내 핸드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였다.
주문이 끊어져 한 달간 공장을 돌리지 않던 사장은 기능공들을 내보내고 싼 월급의 외국 사람 몇 명과 친척 둘을 데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코빌도 두달 치의 월급이 밀린 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형편이었다.
“정원 형, 어디 일해?”
코빌이 쪽지를 보이며 물었다.
“남동공단, 인천 오면 꼭 전화 해. 오케이?”
난 손가락으로 수화기 모양을 하며 말했다.
“일 많아? 여기 일 없어. 돈 쪼금쪼금.”
코빌은 일이 몸에 익은 친구였다.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할 만큼 일에 대한 눈썰미가 밝았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게는 손을 볼 줄도 알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을 했다는코빌은 일꾼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자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일하는 공장으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남동공단에도 일자리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이 몇 배로 많았다. 점심시간에 공단 거리를 바라보면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된다. 그 사람들 중엔 외국인들도 더러 눈에 띄곤 하였다.
“코빌, 잠깐 가게에서 기다려. 형 사무실에 좀 들렸다 갈게.”
손가락으로 컨텔이너 사무실과 길 건너 가게를 번갈아 가리키며 코빌의 어깨를 두드렸다. 코빌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웃음을 머금은 채 가게로 향했다.
사무실엔 사장과 사모가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모의 책상엔 누런 봉투가 몇 개 놓여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제 주긴 주나 보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엔 십만 원 권 수표 세장만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수금이 이것 밖에 안 됐어. 말일 날 한 번 더 들려라. 그 땐 꼭 맟춰 줄게.”
말문이 막혔다. 그마나 저번처럼 빈손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인가. 일이 없고 수금이 안 되는 게 거짓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불경기의 한파는 가구업계가 제일 먼저 맞으니까. 우린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물러났다. 어쩔 수가 없었다. 우선 몇 푼이라도 받는 게 상책인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가게엔 코빌이 친구인 아카와 함께 멀뚱거리며 앉아 있었다. 이 친구들도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일자리와 돈을 찾아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없는 돈 들여 날아 왔건만 월급도 안 나오고 일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왠지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인다. 이 친구들도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지 않은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일했는데.......
코빌이 손가락 두개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웃어 보인다.
“쪼금. 말일 날 나머지 준데.”
난 달력의 날짜를 가리켰다. 사장 말로는 이 친구들도 얼마씩은 해 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 때 가봐야 알 일이었다.
가게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꺼냈다. 코빌에게는 종이 잔을 내밀자 코빌이 맥주병을 가로챈다 . 그리곤 두 손으로 나에게 술을 따른다. 이젠 익숙한 손짓이다. 이들은 쌀밥을 못 먹는다. 점심때에도 삶은 계란과 커피로 때우는 게 보통이다.
허름한 농가에서 나무 잔재를 때며 겨울을 보냈을 이들이 우리보다 더 안타깝다. 코빌과 아카는 외출도 잘 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본국에 돈을 송환하기 위해서 서울을 갈 때와 가끔 시장을 보러 검단에 나가는 게 고작이다.
가게 밖에서 클랙션 소리가 울린다. 현수 형이 가지고 독촉을 하는 것이다. 코빌에 잔에 술 한 잔을 더 따라주고 담배를 샀다.
“코빌, 말일 날 또 올게. 전화 자주하고.”
난 다시 손가락으로 수화기 모양을 하고서 핸드폰을 꺼내 가리켰다. 외국인을 쓰는 공장이 나오면 이들을 연결해 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 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인천 시장 안에 있는 러시아 계통 외국인 노동자들의 술집인 ‘비보집’도 한 번 가기로 약속을 했었다.
“하라쇼(좋아)”
코빌이 손을 내밀었다. 두툼한 손 안에 온기가 느껴졌다. 담배 몇 갑을 두 친구에게 나눠주고 가게를 나섰다. 코빌과 아카가 가게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든다.
“정원 형, 바카 바카(잘 가 잘 가).”
차 안에서 보이는 코빌의 얼굴이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다. 검단 시장에서 만 원 주고 샀다는 청바지는 허옇게 바래져 있고, 검정색 안전화는 칠이 벗겨져 재색으로 변해 있었다.
“코빌, 바카 바카, 전화 해.”
먼지를 이고 있는 개나리가 줄지어 서 있는 길 위로 차는 다시 부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다. 그 개나리와 흙먼지 사이로 코빌의 웃음이 멀어져 갔다.
-'열린 창으로 바라본 다양한 삶의 풍경'중에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145 | 태안바다의 검은 눈물 12 | 김우종 | 2007.12.14 |
| 3144 | 탐라서각연구회 4 | 이윤경 | 2008.10.01 |
| 3143 | 탈핵 관련 <1차 독일견학 국민보고회>와 <2차 독일 견학단 모집> 안내합니다. | 소흘 | 2011.08.14 |
| 3142 | 탄핵무효 백만인대회 동영상3부 | 나무에게 | 2004.03.22 |
| 3141 | 탄핵무효 백만인대회 동영상2부 | 나무에게 | 2004.03.22 |
| 3140 | 탄핵무효 백만인대회 동영상1부 | 나무에게 | 2004.03.22 |
| 3139 | 탄생을 축하합니다 27 | 이승혁 | 2008.04.30 |
| 3138 | 탄생을 축하합니다 14 | 이승혁 | 2009.09.15 |
| 3137 | 탄광촌의 영광이 끝난 자리에서 만난 선생님(?) 2 | 박영섭 | 2008.06.26 |
| 3136 | 탁한 날 맑은 마음으로 쓴 편지.. | 레인메이커 | 2004.04.02 |
| 3135 | 타자, 내 안에 깃들다 2 | 이명옥 | 2007.04.17 |
| 3134 | 크레파스 1 | 김성숙 | 2007.01.09 |
| 3133 | 크레인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4 | 이산 | 2011.06.17 |
| 3132 | 퀼트 5 | 고운펜 | 2007.04.15 |
| 3131 | 쿠바에서 나눈 이야기 (생각을 키우는 교육을 꿈꾸며 ) | 레인메이커 | 2007.02.09 |
| 3130 |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모토 사이클 다이어리1) | 레인메이커 | 2007.02.08 |
| 3129 | 콩 6 | 삼보 | 2007.04.10 |
| 3128 | 콜럼부스의 달걀 -처음처럼 69쪽 3 | 빈주먹 | 2007.02.17 |
| 3127 | 코카콜라의 비밀-열린 모임을 다녀와서 2 | 정용하 | 2004.04.12 |
| » | 코빌의 우울한 봄 2 | 박 명아 | 2007.01.10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