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부처를 아십니까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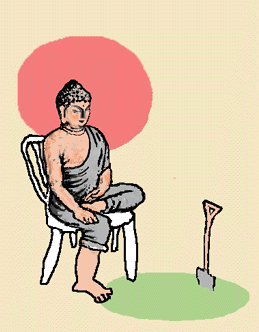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발견한 것은 그녀의 새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와서 내앞을 뚫고 버스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버스 속에서 그 여자를 다시 주목한 것은 그녀의 옷차림때문이었습니다. 입석 버스에서 제일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거동을 관찰하게 된 까닭은 그녀의 집요한 좌석사냥때문이었습니다.
너댓명이 이미 손잡이에 매달려있는 버스에는 구태여 휘둘러보지 않아도 비어 있는 자리가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도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번 세번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리를 양보해 줄만한 사람을 찾아서 다가가기도 하고 주로 젊은이들이 앉는 버스뒷편까지 진출하였지만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초반의 나이로는 경로의 대우를 받기에 부족하였고 그녀의 동작이나 기색으로 봐서도 자리가 필요한 환자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승차하고 난 다음 다음 정거장쯤이던가 그녀가 서있던 곳에서 상당히 먼 앞쪽에 자리가 났습니다. 매우 빠른 동작이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몇개의 정류장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게는 물론 그녀의 성공을 축하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제야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제 여유있게 차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표정도 잠시뿐 마치 바늘을 깔고 앉은 듯 질겁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릴 채비였습니다.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그만 지나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 그 버스 속에서는 나 한사람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본의(?)아니게도 그녀를 승차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도 그녀가 두고 떠난 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미안하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녀는 굽높은 구두로 종종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그녀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뒤바뀐 그녀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백흥암(百興庵)을 찾아가는 길에 지금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버스 속의 여자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마 백흥암이 여성출가자인 비구니(比丘尼)스님들의 도량(道場)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동 팔공산(八公山)계곡에 조용히 안겨 있는 백흥암은 일체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닫힌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빛바랜 백골(白骨)단청에 배어있는 조촐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계곡의 물소리와 목탁소리만 절마당에 고여 있을 뿐 백흥사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맞아준 스님외에는 단 한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적막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수사구가 아닌 글자그대로의 ‘청정수월도량'(淸淨水月道場)이었습니다.
보화루(寶華樓)에도 문을 달아 닫아두었고
보화루 바깥으로 다시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사립문을 둘렀는데 사립밖에는 겨울나기 장작더미가 가즈런히 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해사(銀海寺)의 말사(末寺)이지만 살림은 따로 꾸려간다는 말을 실감케하였습니다.
4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흥암은 아예 재(齋)받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절살림을 걱정하는 나의 물음에 비구니 스님은 소이부답(笑而不答)이었습니다.
봄부터 장작을 마련하고 나물을 캐고 소채를 가꾸는 등 울력(運力)과 수행(修行) 이외의 일은 극소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울력이라는 공동노동에도 생산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승가(僧伽)를 여성출가자에게 개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성불(成佛)할 수 없다는 오장설(五障說)이나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갖 수계(受戒)한 소년비구를 보면 일어서서 영접해야하는 율장(律章) 등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있는 자리가 얼마나 한미한가를 짐작케 합니다. 어쩌면 어느 곳에도 좌석이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백흥암은 3칸의 단아한 극락전 좌우로 심검당(尋劒堂)과 조실방을 달고 있습니다.
동쪽의 심검당은 지혜의 칼을 찾는 선방(禪房)이고 서쪽의 조실방에는 추사가 해배되던 해에 쓴 ‘십홀방장'(十笏方丈)이란 편액과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극락전과 좌우의 요사(寮舍)채가 이루는 절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느껴지지만 저녁 으스럼이나 새벽 미명에 이루어낼 이 작은 공간의 모습이 곧 ‘지혜의 품’이 되리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절’을 보고 싶다는 나의 부탁을 받고 선뜻 백흥암으로 나를 이끌고 간 당신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탈(俗脫)한 절집의 모습과 그 속에서 영위되는 울력과 수행은 분명 주아(主我)와 이욕(利慾)의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싯다르타는 분명히 ‘존재(存在)의 환(幻)'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연기(緣起)속으로 해소함으로써 급기야 생명 그 자체마저도 방기(放棄)하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헤어진 장삼 한 벌과 볼펜 두 자루로 설(說)하는 ‘무소유(無所有)’의 의미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현대자본주의가 쌓아올리는 사유(私有)와 허영의 욕망구조를 질타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막강한 소유구조위에 서있는 무소유의 역설(逆說)은 우리를 쓸쓸하게 합니다.
언덕에 올라 5월의 신록에 안겨 있는 백흥암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쌀이 걱정되어 백흥암을 일컬어 ‘배 큰 암’이라 하면서도 스스로의 소용(所用)을 스스로의 노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스님들은 이를테면 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다 내리고 있는 부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법(說法)하지 않는 백흥사의 정적(靜寂)과 무위(無位)는 그야말로 문자(文字)를 세우지 않은 침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최초의 비구니 ‘마하프라자파티’가 싯다르타를 기른 그의 이모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런 의미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녀가 생후 이레 만에 어머니를 여읜 어린 싯다르타를 길러내었듯이 지금도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말없이 또 한 사람의 싯타르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불현듯 버스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녀는 화려한 단청의 사찰 입구에서 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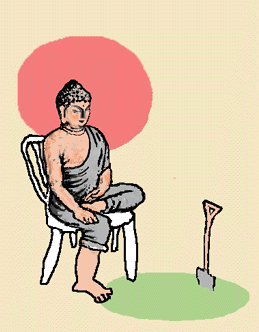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발견한 것은 그녀의 새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와서 내앞을 뚫고 버스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버스 속에서 그 여자를 다시 주목한 것은 그녀의 옷차림때문이었습니다. 입석 버스에서 제일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거동을 관찰하게 된 까닭은 그녀의 집요한 좌석사냥때문이었습니다.
너댓명이 이미 손잡이에 매달려있는 버스에는 구태여 휘둘러보지 않아도 비어 있는 자리가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도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번 세번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리를 양보해 줄만한 사람을 찾아서 다가가기도 하고 주로 젊은이들이 앉는 버스뒷편까지 진출하였지만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초반의 나이로는 경로의 대우를 받기에 부족하였고 그녀의 동작이나 기색으로 봐서도 자리가 필요한 환자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승차하고 난 다음 다음 정거장쯤이던가 그녀가 서있던 곳에서 상당히 먼 앞쪽에 자리가 났습니다. 매우 빠른 동작이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몇개의 정류장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게는 물론 그녀의 성공을 축하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제야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제 여유있게 차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표정도 잠시뿐 마치 바늘을 깔고 앉은 듯 질겁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릴 채비였습니다.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그만 지나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 그 버스 속에서는 나 한사람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본의(?)아니게도 그녀를 승차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도 그녀가 두고 떠난 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미안하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녀는 굽높은 구두로 종종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그녀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뒤바뀐 그녀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백흥암(百興庵)을 찾아가는 길에 지금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버스 속의 여자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마 백흥암이 여성출가자인 비구니(比丘尼)스님들의 도량(道場)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동 팔공산(八公山)계곡에 조용히 안겨 있는 백흥암은 일체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닫힌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빛바랜 백골(白骨)단청에 배어있는 조촐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계곡의 물소리와 목탁소리만 절마당에 고여 있을 뿐 백흥사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맞아준 스님외에는 단 한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적막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수사구가 아닌 글자그대로의 ‘청정수월도량'(淸淨水月道場)이었습니다.
보화루(寶華樓)에도 문을 달아 닫아두었고
보화루 바깥으로 다시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사립문을 둘렀는데 사립밖에는 겨울나기 장작더미가 가즈런히 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해사(銀海寺)의 말사(末寺)이지만 살림은 따로 꾸려간다는 말을 실감케하였습니다.
4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흥암은 아예 재(齋)받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절살림을 걱정하는 나의 물음에 비구니 스님은 소이부답(笑而不答)이었습니다.
봄부터 장작을 마련하고 나물을 캐고 소채를 가꾸는 등 울력(運力)과 수행(修行) 이외의 일은 극소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울력이라는 공동노동에도 생산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승가(僧伽)를 여성출가자에게 개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성불(成佛)할 수 없다는 오장설(五障說)이나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갖 수계(受戒)한 소년비구를 보면 일어서서 영접해야하는 율장(律章) 등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있는 자리가 얼마나 한미한가를 짐작케 합니다. 어쩌면 어느 곳에도 좌석이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백흥암은 3칸의 단아한 극락전 좌우로 심검당(尋劒堂)과 조실방을 달고 있습니다.
동쪽의 심검당은 지혜의 칼을 찾는 선방(禪房)이고 서쪽의 조실방에는 추사가 해배되던 해에 쓴 ‘십홀방장'(十笏方丈)이란 편액과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극락전과 좌우의 요사(寮舍)채가 이루는 절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느껴지지만 저녁 으스럼이나 새벽 미명에 이루어낼 이 작은 공간의 모습이 곧 ‘지혜의 품’이 되리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절’을 보고 싶다는 나의 부탁을 받고 선뜻 백흥암으로 나를 이끌고 간 당신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탈(俗脫)한 절집의 모습과 그 속에서 영위되는 울력과 수행은 분명 주아(主我)와 이욕(利慾)의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싯다르타는 분명히 ‘존재(存在)의 환(幻)'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연기(緣起)속으로 해소함으로써 급기야 생명 그 자체마저도 방기(放棄)하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헤어진 장삼 한 벌과 볼펜 두 자루로 설(說)하는 ‘무소유(無所有)’의 의미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현대자본주의가 쌓아올리는 사유(私有)와 허영의 욕망구조를 질타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막강한 소유구조위에 서있는 무소유의 역설(逆說)은 우리를 쓸쓸하게 합니다.
언덕에 올라 5월의 신록에 안겨 있는 백흥암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쌀이 걱정되어 백흥암을 일컬어 ‘배 큰 암’이라 하면서도 스스로의 소용(所用)을 스스로의 노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스님들은 이를테면 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다 내리고 있는 부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법(說法)하지 않는 백흥사의 정적(靜寂)과 무위(無位)는 그야말로 문자(文字)를 세우지 않은 침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최초의 비구니 ‘마하프라자파티’가 싯다르타를 기른 그의 이모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런 의미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녀가 생후 이레 만에 어머니를 여읜 어린 싯다르타를 길러내었듯이 지금도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말없이 또 한 사람의 싯타르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불현듯 버스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녀는 화려한 단청의 사찰 입구에서 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Articles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