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의 산기슭에서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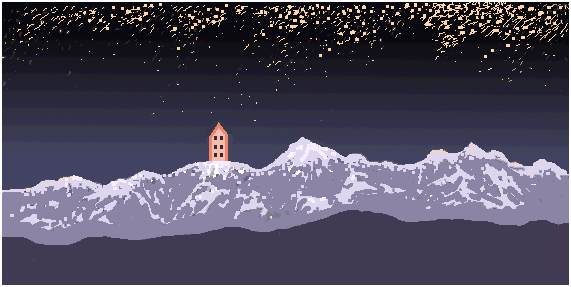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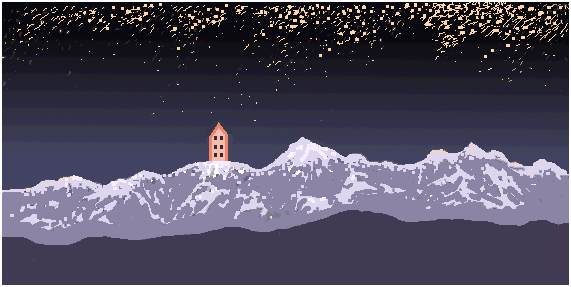
오늘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엽서를 띄웁니다.깜깜한 밤입니다. 이곳의 밤은 서울의 밤이 감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칠흙 같은 어둠입니다. 나는 이 어둠의 거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를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그 엄청난 크기에서 나는 참으로 소름끼치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어떤 운명과 같은 크기로 엄습해옵니다.
촛불 한 개가 밀어낼 수 있는 어둠은 참으로 빈약한 것입니다. 더구나 빈약한 불빛 옆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이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임을 실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안나푸르나 연봉과 마차푸차레의 설산이 차라리 구원처럼 기다려집니다. 아득한 옛날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부딪히면서 솟아올랐다는 히말라야 산맥이 아무리 우람하다 해도 그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말라야를 어둠 속에 묻어둔 하늘에는 설봉(雪峰) 대신 지금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난다(夜深星逾輝)'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힘들고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이 밤 하늘의 별을 자주 바라보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비탈진 기슭에서 척박한 다락논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설산을 지척에 두고 밤에는 찬란한 별들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대한 어둠과 별들, 그리고 신비로운 설산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과연 무엇이 되어 들어와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 개의 작은 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득히 잊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자연의 거대함에 대한 망각이 인간의 오만이 될까 두렵습니다.
네팔에서 히말라야가 차지하는 무게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네팔의 문화이며 네팔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히말라야를 보지 않고 네팔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국지》를 읽지 않고 영웅호걸을 논하는 격이라면 내게 플라잉 사이트〈Flying Sight〉를 권하였습니다. 비행기로 히말라야 연봉을 거쳐 최고봉인 에베레스트까지 비행하는 여행 상품입니다. 나는 히말라야 산군(山群)을 비행기로 다가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외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 한 마리 모기가 되어 거봉(巨峰)의 귓전을 스치는 행위는 내게도 별로 달가운 일이 못 된다 싶었습니다.
나는 플라잉 사이트 대신 히말라야의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나갈코트로 갔습니다. 멀리 히말라야 능선 위로 뜨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나그네의 분수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길을 달려 나갈코트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히말라야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부터 시작된 가랑비가 아침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방향을 바꾸어 비행기 편으로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포카라를 출발하여 이곳 담푸스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밤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점 촛불을 밝혀놓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포카라는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산길을 걷는 트레킹의 출발지입니다. 트레킹이란 등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결정적인 차이는 산을 정복하거나 정상을 탐하는 법 없이 산길을 마냥 걷는 것입니다. 산과 대화를 나누는 등산인 셈입니다. 우리는 돌계단이 많은 트레킹 코스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히말라야를 보지 못한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히말라야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티베트계이거나 셀파족으로 우리와 같은 몽골족입니다. 얼굴 생김새나 말의 억양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혈육을 상봉하는 듯한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많았지요? 이 험한 기슭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마음 속으로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멀고 먼 세월을 흐르고 흘러 여기 이 비탈진 기슭에 용케도 정처를 얻었구나.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모셨구나. 그래도 마음 저버리지 않고 히말라야의 차가운 물에 정갈히 씻어 곱게도 간수했구나. 그들의 순박한 표정은 그 앞에 앉은 내 마음을 한없이 선량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인간에게 투쟁 본능이 있다는 말을 믿지도 않지만 설령 투쟁 본능이 있다고 해도 이 험한 히말라야에서 자연과 씨름하느라 모두 소진시켜버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선량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요. 이곳을 지나 히말라야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산은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神)입니다. 우리는 산이 허락하는 만큼의 땅만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일구지요. 농토의 넓이도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세기도 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히말라야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히말라야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는 영국 측량기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네팔이나 티베트에서는 옛부터 '큰 바다의 이마(사갈고트)' 또는 '세계의 여신(초모랑마)'이라 불러왔습니다. 높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을 남겨두어야 사람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상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그 곳을 오르는 것은 마치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높이를 숫자로 계산하는 일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하물며 정상을 그 산맥과 따로 떼어서 부르는 법도 없습니다. 산맥이 없이 정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이치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뉴질랜드의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영국의 에베레스트 등반대에 참가하여 셰르파 텐징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셰르파와 안내인 등 8,000여 명의 도움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붙일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만치 어둠 속에 있는 마차푸차레는 네팔의 성산(聖山)으로 등산이 금지된 산이지만 발표만 못할 뿐 누군가가 이미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듣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닥불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두려움을 남겨두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에게 인간적일 수 없으며 자연에게 자연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네팔에 오면 먼저 히말라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등산 장비를 짊어지고 히말라야의 어느 정상을 오르거나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계곡의 급류를 찾아가기 전에 히말라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험과 도전이라는 '서부행(西部行)'에 나서기 전에 먼저 어둠과 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숨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문명의 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문화의 '모범'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문화(Culture of Nature)'가 문화의 속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Articles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